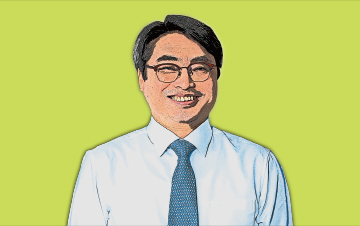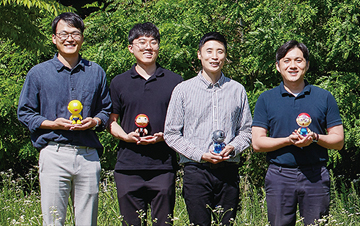미래적 참견시점
지식의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
인공지능이 예술을 하는 시대, 우리는 어떻게 적응하고 발전시켜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자.
글글 코리아나미술관 *c-lab 최선주 큐레이터
(「특이점의 예술-인공지능은 창의적일 수 있는가」 저자)

우리 삶 속에 다가온
인공지능 예술
인공지능 예술

훗날, 2023년은 챗봇 시대의 시작이라고 기록될지도 모른다. 작년 가을 챗GPT가 공개된 이래로 챗봇에 대한 관심은 식을 줄 모르고 계속 뜨거워지고 있다. 출시된 지 2개월이 지난 2023년 1월, 챗GPT는 1억 명 이상의 사용자를 확보하며 역대 가장 빠르게 성장한 서비스로 기록되었다. 챗GPT 열풍 이전에 우리는 몇 해 전 대한민국을 흔들었던 사건을 기억하고 있다.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국’을 굳이 다시 언급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 사회 구성원이 함께 겪은 일생일대의 사건이기 때문이다.
예술 분야에서도 인공지능은 화두였다. 인간성의 마지막 보루로서 창의성과 예술,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여 창작하는 방법 등에 대한 많은 토론이 있었다. 국내에선 2016년 아트센터나비(Art Center Nabi)가 인공지능을 최초로 다뤘고, 이 전시를 시작으로 한국에서도 인공지능을 주제로 한 다양한 전시와 행사가 진행되었다. 세계적인 미디어아트 페스티벌인 아르스 일렉트로니카 페스티벌(Ars Electronica Festival)도 2017년 페스티벌의 제목을 《인공지능, 또 다른 나》로 정하고, 페스티벌 동안 기술을 소개하는 워크숍과 강의, 인공지능의 창의성에 관한 콘퍼런스도 함께 진행하면서 인공지능 예술을 깊이 있게 다루고자 시도했다. 2018년 크리스티 경매에서 인공지능이 그린 초상화 <에드몽 드 벨라미(Edmond de Belamy)>가 약 5억 원에 낙찰되며 인공지능 예술의 가능성을 본격적으로 알렸다.
인공지능을 다룬 수많은 예술 사례 중 주목해야 할 사례는 최초의 휴머노이드 인공지능 아티스트, 에이다(Ai-Da)이다. 에이다는 기존의 인공지능과 달리 손(기계 장치)과 눈(카메라)가 있는 인간 형태의 휴머노이드인데,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여, 로봇 손으로 바로 그림을 그려낼 수 있다. 2019년 옥스퍼드 대학의 갤러리에서 첫 개인전 《담보할 수 없는 미래 (Unsecured Futures)》를 열었고, 지금도 전시, 아티스트 토크, 퍼포먼스 협업 활동 등 다양한 예술 활동을 펼치고 있다. 얼마 전, 2023년 4월에는 런던 디자인 박물관에서 대규모 회화 전시를 열었다.
에이다의 사례가 중요한 것은 의식의 여부와 별개로 “인간만이 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예술 창작”에 의문을 던지기 때문이다. 에이다가 만들어 내는 창작물이 인간의 것과 구분할 수 없다면 인공지능도 창의적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일반적으로 창의성은 “새롭고 독창적인 것을 만들어 내는 능력”, “전통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서 비일상적인 생각을 산출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그러나 인공지능의 창의성을 정의하기 위해서 창의성을 ‘인간적 창의성’으로만 한정할 수는 없다. 창의성이 발휘되려면 “사물을 알아보고, 기억하고, 인지하는 등 일상에서 필요한 수많은 심리적 행위를 능숙히 수행하는 능력”이 필요한데, 이는 복잡한 지적 구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창의성이란 마법 같은 일이 아니라 원료가 되는 아이디어를 결합해 재생산한 결과이기도 한 것이다. 인지 과학자이자 컴퓨터 과학자인 더글러스 호프스태터(Douglas Hofstadter)는 “인간 역시 자신의 심상이 어디서 오는지 정확히 알 수 없고, 선택과 조합의 무한한 가능성 앞에서 무력할 뿐”이라고 언급했다.1) 다시 말해 인간도 자신의 창작 행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완전히 알지 못하고 일종의 직관적인 감각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프로그램이라고 할지라도 자기-지식(데이터)과 자기-무지(직관) 사이 미묘한 균형을 이룰 수 있다면 그것을 예술가로 부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예술 분야에서도 인공지능은 화두였다. 인간성의 마지막 보루로서 창의성과 예술,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여 창작하는 방법 등에 대한 많은 토론이 있었다. 국내에선 2016년 아트센터나비(Art Center Nabi)가 인공지능을 최초로 다뤘고, 이 전시를 시작으로 한국에서도 인공지능을 주제로 한 다양한 전시와 행사가 진행되었다. 세계적인 미디어아트 페스티벌인 아르스 일렉트로니카 페스티벌(Ars Electronica Festival)도 2017년 페스티벌의 제목을 《인공지능, 또 다른 나》로 정하고, 페스티벌 동안 기술을 소개하는 워크숍과 강의, 인공지능의 창의성에 관한 콘퍼런스도 함께 진행하면서 인공지능 예술을 깊이 있게 다루고자 시도했다. 2018년 크리스티 경매에서 인공지능이 그린 초상화 <에드몽 드 벨라미(Edmond de Belamy)>가 약 5억 원에 낙찰되며 인공지능 예술의 가능성을 본격적으로 알렸다.
인공지능을 다룬 수많은 예술 사례 중 주목해야 할 사례는 최초의 휴머노이드 인공지능 아티스트, 에이다(Ai-Da)이다. 에이다는 기존의 인공지능과 달리 손(기계 장치)과 눈(카메라)가 있는 인간 형태의 휴머노이드인데,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여, 로봇 손으로 바로 그림을 그려낼 수 있다. 2019년 옥스퍼드 대학의 갤러리에서 첫 개인전 《담보할 수 없는 미래 (Unsecured Futures)》를 열었고, 지금도 전시, 아티스트 토크, 퍼포먼스 협업 활동 등 다양한 예술 활동을 펼치고 있다. 얼마 전, 2023년 4월에는 런던 디자인 박물관에서 대규모 회화 전시를 열었다.
에이다의 사례가 중요한 것은 의식의 여부와 별개로 “인간만이 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예술 창작”에 의문을 던지기 때문이다. 에이다가 만들어 내는 창작물이 인간의 것과 구분할 수 없다면 인공지능도 창의적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일반적으로 창의성은 “새롭고 독창적인 것을 만들어 내는 능력”, “전통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서 비일상적인 생각을 산출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그러나 인공지능의 창의성을 정의하기 위해서 창의성을 ‘인간적 창의성’으로만 한정할 수는 없다. 창의성이 발휘되려면 “사물을 알아보고, 기억하고, 인지하는 등 일상에서 필요한 수많은 심리적 행위를 능숙히 수행하는 능력”이 필요한데, 이는 복잡한 지적 구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창의성이란 마법 같은 일이 아니라 원료가 되는 아이디어를 결합해 재생산한 결과이기도 한 것이다. 인지 과학자이자 컴퓨터 과학자인 더글러스 호프스태터(Douglas Hofstadter)는 “인간 역시 자신의 심상이 어디서 오는지 정확히 알 수 없고, 선택과 조합의 무한한 가능성 앞에서 무력할 뿐”이라고 언급했다.1) 다시 말해 인간도 자신의 창작 행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완전히 알지 못하고 일종의 직관적인 감각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프로그램이라고 할지라도 자기-지식(데이터)과 자기-무지(직관) 사이 미묘한 균형을 이룰 수 있다면 그것을 예술가로 부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17년 아르스 일렉트로니카 페스티벌의 모습
©Ars Electronica/Christopher Sonnleitner

Ai-Da, <Algorithm Queen>(2022) ©Ai-Da
우리는 어떻게
창의성을 발현해야 할까?
창의성을 발현해야 할까?

인공지능이 지금의 인간만큼 창의적일 수 있다면, 미래의 인간은 어떻게 창의성을 발현해야 하며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인공지능을 인문학적으로 탐구해 온 오영진 교수는 <인공지능 시대의 예술>이라는 수업에서 40명의 학생과 함께 챗GPT를 사용해 시를 작성했다. 봄날을 소재로 한 40개의 시는 처음에는 상투적이었으나 3~4회의 조정과정을 거치고 완성된 시는 여러 감정의 풍경을 담고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0개의 시를 하나의 시로 통합했고 아래와 같은 문장이 탄생했다. 오영진 교수는 이를 “기계가 준 선물”이라고 표현했다.2)

Chatgpt
40개의 시가 하나의 기도가 될 때
혼돈과 다툼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삶의 의미를 찾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평화를 찾아 외칩니다.
모든 혼란은 결코 멈추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이는 자연의 아름다움에서 위안을 찾고,
광대하고 웅장하며 가장 순수한 생물인
산과 바다와 나무와
모두 자유로운 언어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가족과 친구들의 사랑에서 위안을 찾고,
친절은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기쁨을, 우리 시대에 빛을,
그리고 가장 어두운 길을 통해 우리를 도우소서.
고통과 슬픔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내일에 대한 절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도움과 희미한 희망을 부르짖습니다.
그들은 대처할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투쟁과 다툼 속에서
희미한 희망과 삶의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문제를 극복하고 극복할 수 있는 힘.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아름다움을 보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인도하고 만나게 하기 위해 항상 거기에 있는 사랑.
마음속에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출발로 세상과 맞서십시오.
두 팔을 벌려 이 세상을 껴안고,
그 때 느끼는 세상의 매력에서 아름다움을 찾으십시오.
온 마음과 영혼을 다해 사랑합시다.
이 세상을 더 보기 좋은 곳으로 만드십시오.
서울과기대, 인공지능 시대의 예술 수강생 전원 & 챗GPT 230322 3)
우리는 삶의 의미를 찾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평화를 찾아 외칩니다.
모든 혼란은 결코 멈추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이는 자연의 아름다움에서 위안을 찾고,
광대하고 웅장하며 가장 순수한 생물인
산과 바다와 나무와
모두 자유로운 언어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가족과 친구들의 사랑에서 위안을 찾고,
친절은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기쁨을, 우리 시대에 빛을,
그리고 가장 어두운 길을 통해 우리를 도우소서.
고통과 슬픔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내일에 대한 절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도움과 희미한 희망을 부르짖습니다.
그들은 대처할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투쟁과 다툼 속에서
희미한 희망과 삶의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문제를 극복하고 극복할 수 있는 힘.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아름다움을 보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인도하고 만나게 하기 위해 항상 거기에 있는 사랑.
마음속에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출발로 세상과 맞서십시오.
두 팔을 벌려 이 세상을 껴안고,
그 때 느끼는 세상의 매력에서 아름다움을 찾으십시오.
온 마음과 영혼을 다해 사랑합시다.
이 세상을 더 보기 좋은 곳으로 만드십시오.
서울과기대, 인공지능 시대의 예술 수강생 전원 & 챗GPT 230322 3)
필자는 인공지능과 인간과의 관계를 풀 수 있는 실마리를 과거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예를 들면 새로운 기술에 대해 두려움 없이 해석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찾고자 했던 미디어 아티스트 백남준처럼 말이다. 백남준은 잘 알려진 것처럼, 비디오, 텔레비전, 로봇 등 당시 새롭게 등장한 기술 매체를 창작의 영역에서 자유롭게 사용했다. 1984년 1월 1일, 백남준은 그 당시 전쟁 기술이었던 인공위성을 사용하여 세계를 연결하는 <굿모닝 미스터 오웰>이라는 작업을 선보였다. 그는 백여 명의 아티스트와 함께 뉴욕, 파리, 베를린, 서울, 4개 도시를 연결했고, 이는 당시 최초의 인공위성 생중계 방송이었다. 이 퍼포먼스를 통해 백남준은 인공위성을 세계를 지배하는 ‘빅 브라더의 눈이 아니라 세계를 연결하는 네트워크 망’으로 재탄생시켰다. 다시 말해 그의 상상력이 기술의 미래를 정해진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길로 제시하며 그 용도를 변경한 것이다. 그럼으로써 인공위성 기술은 인간을 위협하는 두려운 것이 아니라 표현의 한계를 확장해 주는 수단이 되었다.

오늘날 인공지능은 일반적인 것이 되었다. 온 나라가 떠들썩했던 과거와 달리 챗GPT는 조용히 그리고 빠르게 실생활에 스며들고 있다. 메일 답장을 쓸 때 참고하기 좋은 영어 문장을 수십 개 써주고, 필요한 작업을 말로 설명하면 엑셀에 바로 쓸 수 있는 수식도 만들어 준다. ‘출근할 때 듣기 좋은 노래 목록'이나 ‘만들기 쉬운 건강한 식단’, ‘다리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법’을 요청할 수도 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 미국의 한 블로거는 챗GPT를 이용해서 매분 마다 새로운 시를 써주는 시계를 제작했다.4) 그는 이렇게 만든 시계를 자신의 책장에 올려두고 매일 새로운 영감을 얻는다고 한다. 만들기 위해 사전에 알아야 하는 건 없다. 아이디어만 있다면 어떻게 제작하는지 하나부터 열까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엇을 만들 것인지는 스스로 알아야 한다.
새로운 창의성의 영역으로
나아가야 할 것
나아가야 할 것

챗GPT에게 어떤 질문을 던질지 고민하는 것부터 세심하게 프롬프트를 조정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 계속 대화를 시도하는 과정은 마치 인류가 지금까지 모아둔 지식의 은하수를 여행하는 것과 같다. 그것은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문장과 지식을 만나는 시간이다. 그리고 이는 앞서 호프스태터가 말한 자기-지식과 자기-무지 사이의 균형을 이루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지금의 창의적인 행위만이 인간적이며, 그를 통해서만 인간성을 지킬 수 있다는 결론은 점차 확장되는 기계의 창의성 앞에 공허해지기 마련이다. 그렇기에 기계의 창의성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고민하며, 우리는 새로운 창의성의 영역으로 나아가야 한다. 무한히 펼쳐진 지식의 은하수를 여행하며 주체적으로 변혁을 꾀하는 모험가가 된다면 기술의 발전이 두려운 일만은 아닐 것이다.

1) 더글러스 호프스태터, 「괴델, 에셔, 바흐: 영원한 황금 노끈」, 박여성, 안병서 옮김(까치, 2017), 986.
2) 오영진, ‘40개의 시가 하나의 기도가 될 때’, arte365, 2023. 4. 10. br https://arte365.kr/?p=98525&fbclid=IwAR3-9ojzuZlHE81IUhqX7OkbU19K2b0eeTwUjMxVopj4aMzimQelOSFG9nE
3) ‘40개의 시가 하나의 기도가 될 때’(인공지능 기반 집체시), https://youtu.be/JMARuNtcNsg
4) https://poem.town/clock/about
관련 컨텐츠
 PDF다운로드
PDF다운로드 지난호보기
지난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