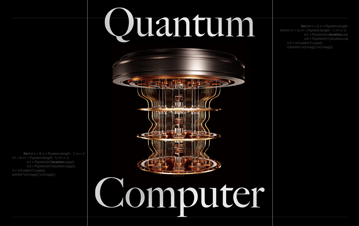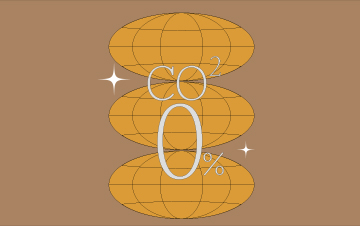테마 인문학
도전이라는 이름의 진심
메이저리그에서 배우는
도전과 진심
도전과 진심
메이저리그는 감동과 희망을 주는 꿈의 무대이다.
선수와 코치가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 성취를 이루어낸 메이저리그 도전사에 대해 알아보자.
글 전훈칠 MBC 기자(《메이저리그, 진심의 기록》 저자)

야구 인생을 포기할 뻔했던 잰슨은 현역 최고의 마무리 투수로 거듭났다(출처:보스턴 레드삭스 구단 공식 SNS)
포수에서 투수가 된
켄리 잰슨의 도전
켄리 잰슨의 도전
“느슨하다. 쉽고 편하다.” 메이저리그 전문 매체 <베이스볼 아메리카>는 보스턴의 마무리 투수 켄리 잰슨의 투구 자세를 이렇게 표현했다. 투수는 마운드 위 투구판에 발을 딛고 난 뒤부터 다리와 허리, 어깨에 차례로 힘을 전달해 모든 기운을 손끝에 모아 뿌린다. 힘을 모아 던지는 원리만 따지면 이론적으로 완벽한 투구 자세도 있다. 다만 실제 투구 자세는 사람의 지문처럼 각자 다르다. 그럼에도 잰슨의 투구 자세는 유독 남다르다. 그렇게 형성된 이유가 있다. 2004년 잰슨이 LA 다저스와 계약했을 때, 그는 포수였다. 주목받는 선수는 아니었다. 마이너리그에서 5년 넘게 버티던 2009년, 잰슨이 야구계에서 잠시 화제가 된 적이 있다. 네덜란드 대표팀 소속으로 월드베이스볼클래식에 참가해 강력한 송구로 2루에서 주자를 잡아냈을 때였다. 그때뿐이었다. 대회가 끝나자 서커스 같은 2루 송구는 추억이 됐고, 다시 기약 없는 마이너리그 생활이 이어졌다.
그해 다저스 마이너리그 담당자가 잰슨을 불러 면담했다. 5년 넘도록 싱글A 수준에서도 2할 3푼 타율을 찍지 못하는 선수에게 미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제안을 했다. 월드베이스볼클래식에서 보여준 강력한 송구 능력을 살리면 투수로는 해볼 만하지 않겠냐는 것이었다. 잰슨은 자신을 무시하는 발언이라고 느꼈다. 주위의 평가가 어떻든 평생 갈고 닦은 게 포수로서의 능력인데, 갑자기 투수를 하라니. 실패자가 됐다는 생각이 들었고, 야구를 그만두라는 완곡한 신호로 받아들였다. 그런데 다저스는 진심이었다. 마이너리그 5시즌 동안 92명의 주자를 잡아낸 잰슨의 어깨는 투수로도 가치가 있다고 확신했다. 사실 잰슨에게도 뚜렷한 대안이 없었다. 결국 투수 전환을 받아들인 잰슨은 전설적인 너클볼 투수 찰리 허프의 도움 속에 새 출발에 나선다.
허프 코치가 잰슨을 투수로 만들기 위해 가장 주목한 것은 그의 투구 능력이 아닌 현실적인 상황이었다. 선수로서 최소한의 인정조차 받지 못했다는 좌절감. 마이너리그에서 5년 넘게 허비했다는 상실감. 게다가 잰슨은 리틀 리그 시절 이후 투수로는 한 번도 경기를 치른 적이 없는 상태였다. 허프 코치는 자존감마저 바닥까지 떨어진 잰슨이 스스로 받아들일 수 있는 훈련 방식을 먼저 생각했다. 여러 고민 끝에 허프 코치는 잰슨에게 가장 단순한 투구 동작을 시도하도록 했다. 이상적인 투구 이론을 앞세워 온몸을 쥐어짜 손끝까지 힘을 모은 뒤 뿌리도록 하면 더 강력한 공을 던질 수도 있겠지만, 투수 경력이 거의 없는 잰슨의 몸에 무리가 갈 가능성이 컸다. 잰슨이 부상이라도 겪는다면 중도에 바로 포기할 수도 있었다. 그래서 허프는 잰슨에게 이론적인 투구법을 강요하지 않았다. 복잡한 요소가 결합된 투구 방식은 그만큼 수정해야 할 요인도 많아지니 아예 한계를 인정하고 최대한 단순한 자세로 공을 던지라고 주문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196cm의 큰 키를 감안해 보폭을 넓게 딛고 던지는 이점만은 살리도록 했다.
그렇게 나온 것이 바로 ‘느슨하면서도 쉽고 편한’ 투구 자세였다. 그러니까 최상의 투구를 찾다가 나온 것이 아닌, 잰슨이 거부감없이 받아들일 만한 방법을 고민하다 만든 자세였다. 교과서적인 투구 자세와 거리가 멀고, 조금 엉성한 구석까지 엿보였지만 잰슨의 타고난 어깨를 활용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었다. 이 자세로 실전에서 자신의 공이 통하는 것을 확인한 잰슨은 이후 자신감을 얻어 최상급 마무리 투수로 거듭났다. 잰슨은 2017년 내셔널리그 구원왕에 오른 뒤 ‘허프 코치에게 큰 빚을 졌다’고 말했다.
마이너리그에서조차 성과는커녕 퇴보만 거듭하던 상황에서 선수 자신도 모르던 잠재력을 포착한 구단 관계자. 그것을 선수가 받아들이도록 합리적으로 이끈 코치진. 그리고 모든 현실을 인정하고 발전적으로 임무를 수행한 선수 자신까지. 마이너리그에서 무명으로 사라질 수도 있던 선수 하나가 메이저리그 현역 최다 세이브 투수로 우뚝 서기까지 이렇게 많은 이들의 진심 어린 도전이 어우러졌다.
그해 다저스 마이너리그 담당자가 잰슨을 불러 면담했다. 5년 넘도록 싱글A 수준에서도 2할 3푼 타율을 찍지 못하는 선수에게 미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제안을 했다. 월드베이스볼클래식에서 보여준 강력한 송구 능력을 살리면 투수로는 해볼 만하지 않겠냐는 것이었다. 잰슨은 자신을 무시하는 발언이라고 느꼈다. 주위의 평가가 어떻든 평생 갈고 닦은 게 포수로서의 능력인데, 갑자기 투수를 하라니. 실패자가 됐다는 생각이 들었고, 야구를 그만두라는 완곡한 신호로 받아들였다. 그런데 다저스는 진심이었다. 마이너리그 5시즌 동안 92명의 주자를 잡아낸 잰슨의 어깨는 투수로도 가치가 있다고 확신했다. 사실 잰슨에게도 뚜렷한 대안이 없었다. 결국 투수 전환을 받아들인 잰슨은 전설적인 너클볼 투수 찰리 허프의 도움 속에 새 출발에 나선다.
허프 코치가 잰슨을 투수로 만들기 위해 가장 주목한 것은 그의 투구 능력이 아닌 현실적인 상황이었다. 선수로서 최소한의 인정조차 받지 못했다는 좌절감. 마이너리그에서 5년 넘게 허비했다는 상실감. 게다가 잰슨은 리틀 리그 시절 이후 투수로는 한 번도 경기를 치른 적이 없는 상태였다. 허프 코치는 자존감마저 바닥까지 떨어진 잰슨이 스스로 받아들일 수 있는 훈련 방식을 먼저 생각했다. 여러 고민 끝에 허프 코치는 잰슨에게 가장 단순한 투구 동작을 시도하도록 했다. 이상적인 투구 이론을 앞세워 온몸을 쥐어짜 손끝까지 힘을 모은 뒤 뿌리도록 하면 더 강력한 공을 던질 수도 있겠지만, 투수 경력이 거의 없는 잰슨의 몸에 무리가 갈 가능성이 컸다. 잰슨이 부상이라도 겪는다면 중도에 바로 포기할 수도 있었다. 그래서 허프는 잰슨에게 이론적인 투구법을 강요하지 않았다. 복잡한 요소가 결합된 투구 방식은 그만큼 수정해야 할 요인도 많아지니 아예 한계를 인정하고 최대한 단순한 자세로 공을 던지라고 주문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196cm의 큰 키를 감안해 보폭을 넓게 딛고 던지는 이점만은 살리도록 했다.
그렇게 나온 것이 바로 ‘느슨하면서도 쉽고 편한’ 투구 자세였다. 그러니까 최상의 투구를 찾다가 나온 것이 아닌, 잰슨이 거부감없이 받아들일 만한 방법을 고민하다 만든 자세였다. 교과서적인 투구 자세와 거리가 멀고, 조금 엉성한 구석까지 엿보였지만 잰슨의 타고난 어깨를 활용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었다. 이 자세로 실전에서 자신의 공이 통하는 것을 확인한 잰슨은 이후 자신감을 얻어 최상급 마무리 투수로 거듭났다. 잰슨은 2017년 내셔널리그 구원왕에 오른 뒤 ‘허프 코치에게 큰 빚을 졌다’고 말했다.
마이너리그에서조차 성과는커녕 퇴보만 거듭하던 상황에서 선수 자신도 모르던 잠재력을 포착한 구단 관계자. 그것을 선수가 받아들이도록 합리적으로 이끈 코치진. 그리고 모든 현실을 인정하고 발전적으로 임무를 수행한 선수 자신까지. 마이너리그에서 무명으로 사라질 수도 있던 선수 하나가 메이저리그 현역 최다 세이브 투수로 우뚝 서기까지 이렇게 많은 이들의 진심 어린 도전이 어우러졌다.
배트를 바꾼 골드슈미트의
탐구정신
탐구정신

골드슈미트가 11년 넘게 쓴 배트 대신 택한
‘퍽 손잡이 배트’
(출처:데릭 굴드 세인트루이스 기자 트위터)
‘퍽 손잡이 배트’
(출처:데릭 굴드 세인트루이스 기자 트위터)
도전이라는 단어가 미완의 존재에게만 붙여지는 것은 아니다. 2011년 데뷔한 세인트루이스의 폴 골드슈미트는 가장 성공적인 경력을 이어가고 있는 현역 선수로 꼽힌다. 홈런왕과 타점왕, MVP와 골드글러브, 실버슬러거까지 외형적인 수상실적도 엄청나다. 우리에게는 류현진의 데뷔 초 천적으로 군림하던 모습이 잘 알려져 있다. (통산 류현진 상대타율 0.423) 30대 중반이 되어서도 꾸준한 활약을 이어가고 있는 골드슈미트. 그 비결은 탐구 정신을 바탕으로 한 도전이다. 이치로처럼 매일 먹는 식사의 종류부터 훈련 방법과 취침 습관, 그리고 시즌이 끝난 후 겨우내 이뤄지는 관리까지 치밀한 일관성으로 비범함을 유지하는 경우도 있지만 골드슈미트는 결이 조금 다르다. 골드슈미트에게 시즌이 끝난 뒤의 휴식기는 평소의 호기심과 탐구 정신을 몸소 구현할 중요한 기회다. 평소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디테일에 몰두하는 것으로 유명한 골드슈미트는 2021시즌이 끝난 뒤 팀 동료 놀런 아레나도와 맷 카펜터를 설득해 야구 장비 업체가 운영하는 연구소에 방문하기도 했다. 선수용 맞춤 배트를 제작하는 해당 연구소에서 골드슈미트는 자신의 신체 구조와 스윙 동작에 가장 적합한 배트를 찾는 실험을 자청했다. 그 과정에서 배트의 길이와 무게는 물론, 나무 소재에 따른 차이까지 다각적으로 검증했다. 이유가 있었다.
좋은 배트를 고르는 지식뿐 아니라 자신의 스윙 동작에 대한 생체학적 지식까지 확보하면 훗날 나이가 들어 신체의 능력이 떨어졌을 때 능동적으로 문제점에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지금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향후 닥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사전 준비를 해놓으려는 셈이었다. 순수한 열망으로 연구소 방문을 감행한 골드슈미트는 결국 데뷔 후 11년간 사용했던 길이 86.4cm, 무게 907g짜리의 배트를 버리고 대신 손잡이가 아이스하키의 퍽 모양으로 제작된 배트를 새롭게 쓰기로 했다.
31개의 홈런을 기록하고 MVP 투표 6위에 오른 선수가 생체학적 실험까지 진행한 뒤 애용하던 배트를 바꾸는 것은 흔히 볼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결과는 어땠을까. 골드슈미트는 배트를 바꾼 2022시즌에 데뷔 후 첫 내셔널리그 MVP에 올랐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닌 자발적인 도전의 결과물이었다. (함께 연구소에 방문한 뒤 같은 배트로 바꾼 아레나도 역시 MVP 3위에 오르며 대활약했다.)
좋은 배트를 고르는 지식뿐 아니라 자신의 스윙 동작에 대한 생체학적 지식까지 확보하면 훗날 나이가 들어 신체의 능력이 떨어졌을 때 능동적으로 문제점에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지금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향후 닥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사전 준비를 해놓으려는 셈이었다. 순수한 열망으로 연구소 방문을 감행한 골드슈미트는 결국 데뷔 후 11년간 사용했던 길이 86.4cm, 무게 907g짜리의 배트를 버리고 대신 손잡이가 아이스하키의 퍽 모양으로 제작된 배트를 새롭게 쓰기로 했다.
31개의 홈런을 기록하고 MVP 투표 6위에 오른 선수가 생체학적 실험까지 진행한 뒤 애용하던 배트를 바꾸는 것은 흔히 볼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결과는 어땠을까. 골드슈미트는 배트를 바꾼 2022시즌에 데뷔 후 첫 내셔널리그 MVP에 올랐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닌 자발적인 도전의 결과물이었다. (함께 연구소에 방문한 뒤 같은 배트로 바꾼 아레나도 역시 MVP 3위에 오르며 대활약했다.)
우리 모두의 도전은 진심
태어나면서 이미 청각 기능의 95%가 상실된 상태였던 커티스 프라이드. 그는 아마추어 시절부터 2루 주자로 출루했을 때 3루 코치가 외치는 신호음을 들을 수 없어 주루 플레이 도중 시행착오를 겪곤 했다. 그럴 때마다 모욕적인 말을 듣기도 했다. 하지만 프라이드는 빅리거가 되겠다는 목표 하나로 자신만의 야구 방식을 만들었다. 이후 2루 주자로 나가는 상황이 벌어지면 상대 팀 유격수의 그림자 위치와 모양을 곁눈으로 확인해 자신에 대한 견제를 미리 알아차리고 대응한 것이다. 소리는 듣지 못했지만 사소한 입술 모양만으로도 상대의 대화 내용을 알아채 경기에 활용한 것도 메이저리그 선수로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었다고 했다. (영어뿐 아니라 스페인어의 입술 모양도 익혔다고 한다.) 주위의 비아냥을 도전의 자극제로 삼은 프라이드는 결국 14년간 빅리그에서 살아남았다.
결실을 본 도전만 의미 있는 것은 아니다. 지난 2월 미국 대학야구에는 괴물 투수가 등장했다는 소식으로 들썩였다. 미시시피 주립대 소속의 신입생 투수 주란젤로 세인자가 실전에서 왼손, 오른손으로 각각 투구를 펼친 끝에 4이닝 무실점을 기록한 것이다. 오른손으로 최고 구속 156km/h를 찍었고 왼손으로도 148km/h의 공을 던졌다. 오타니가 투수와 타자로 동시에 뛰는 것은 메이저리그라는 최고 수준의 무대에서 행하는 일이기에 찬사를 받는 것일 뿐, 투타 동반 활약 자체는 아마추어 야구에서 흔한 일이다. 그러나 세인자와 같이 양손으로 모두 투구하는 것은 상온 초전도체의 발견처럼 물리적으로 벌어질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일을 현실에서 구현한 것이어서 차원이 다른 도전이다. 아쉽게도 세인자는 양손 투구를 통해 꾸준한 성적을 내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려는 도전 의지만큼은 굳건하다. 내년 이후 신인 드래프트에 참여할 수 있는 세인자가 끝까지 양손 투구를 고수할지 지켜볼 일이다.
모든 도전에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닌, 스스로 탐구한 끝에 시도한 도전이라면 어떤 식이든 가치를 둘 만하다. 최고의 마무리 투수가 된 잰슨이나 빅리거 자체가 목표였던 프라이드 모두 특정 결과를 계산해 두고 움직였다면 지금과 같은 결과를 얻지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도전은 진심과 어울릴 수밖에 없다.
관련 컨텐츠
 PDF다운로드
PDF다운로드 지난호보기
지난호보기